스토아 학파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스토아 학파는 기원전 3세기부터 2세기까지 활동한 헬레니즘 철학 학파로,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된다. 이들은 자연학, 논리학, 윤리학을 연구했으며, 특히 윤리학을 중시했다. 스토아 철학은 이성을 통해 지식을 얻고, 정념을 극복하며, 덕을 실천하는 삶을 강조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세계 시민 의식과 인지 행동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스토아 학파 - 로고스
로고스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비롯된 다의어로, 철학, 종교, 심리학 등 다양한 사상에서 이성, 논리, 세계의 원리, 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사용된다. - 스토아 학파 - 관용론
세네카의 《관용론》은 네로 황제의 통치 안정 및 정당화를 위해 쓰여진 정치적 저술로, 훌륭한 통치자와 폭군의 차이를 제시하며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역사적 사례와 스토아 철학을 통해 관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르네상스 이후 재평가되어 현대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삶의 철학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삶의 철학 - 윤리학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와 가치를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로, 고대부터 다양한 사상이 발전해 왔으며, 규범 윤리학, 응용 윤리학, 가치론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뉜다.
2.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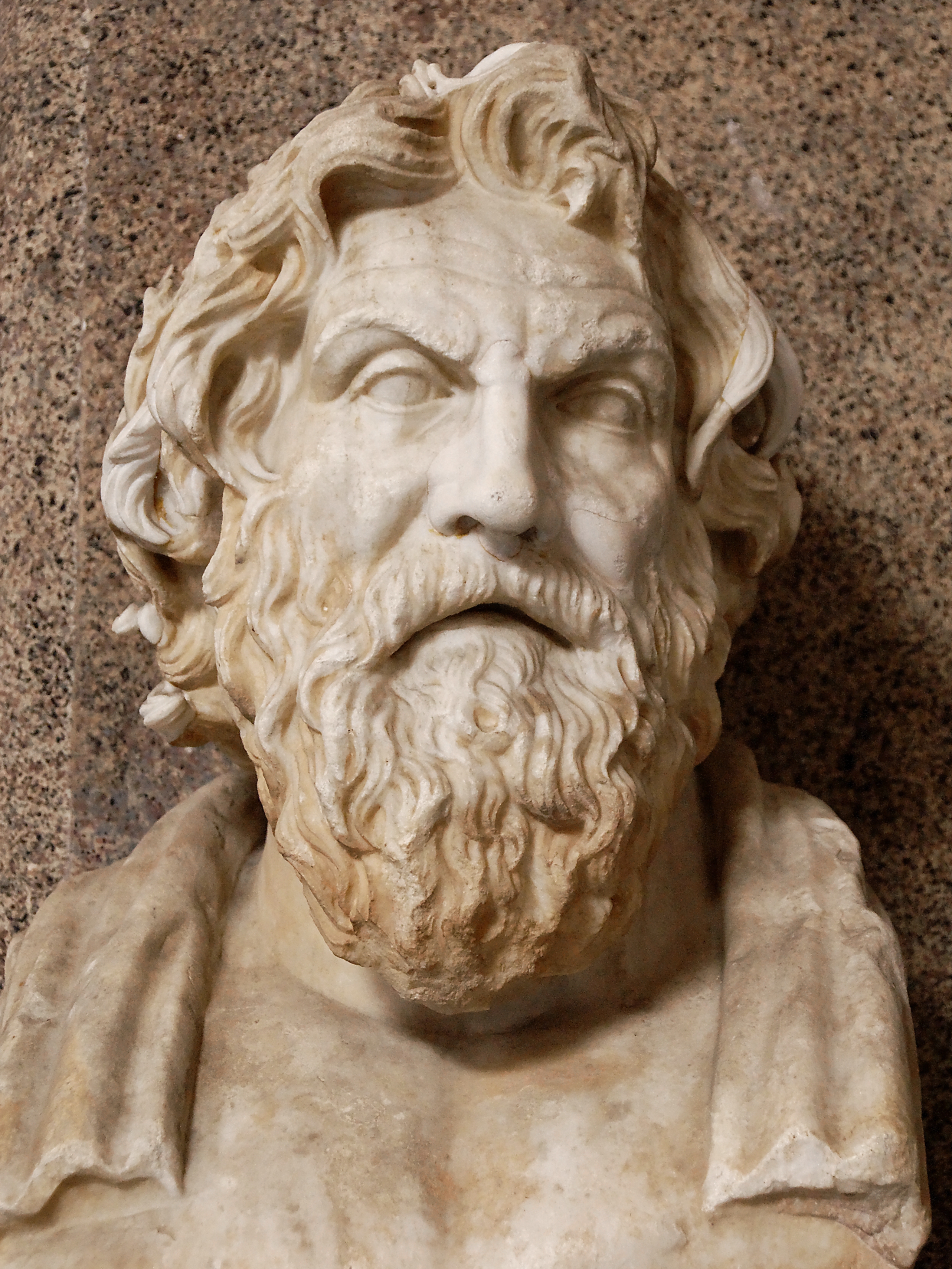
스토아 학파는 기원전 3세기 제논에 의해 창시되었으며,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제국 시대를 거치며 세 시기로 구분된다.
- 고(古) 스토아 시기 (기원전 3세기): 제논, 클레안테스, 크리시포스 등이 활동한 시기로, 아테네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 중기 스토아 시기 (기원전 2세기 ~ 기원전 1세기): 파나이티오스, 포세이도니오스 등이 활동한 시기로, 주로 로마로 활동 무대가 옮겨졌다. 이들은 대부분 소아시아 출신의 셈계 사람들이었다.
- 후기 스토아 시기 (1세기 ~ 2세기): 세네카,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이 활동한 시기이다.
초기 스토아 학파의 저작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후기 스토아 철학자들의 저작을 통해 초기 사상을 재구성할 수 있다.[127]
스토아주의라는 이름은 키티온의 제논과 그의 추종자들이 아테네의 고대 아고라 북쪽에 있는 주랑인 ''채색된 주랑''(고대 그리스어: ἡ ποικίλη στοά)에서 유래되었다.[10] 제논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달리 자신의 철학을 공공장소에서 가르쳤다. 스토아주의는 원래 제논주의로 알려졌으나, 인물 숭배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곧 이 이름은 바뀌었다.[11]
제논의 사상은 견유학파의 사상에서 발전했으며, 크리시포스는 스토아주의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12] 스토아주의는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제국의 교육받은 엘리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철학이 되었으며,[14] 후기 로마 스토아 학파는 우주 안에서 조화로운 삶을 사는 데 집중했다.
스토아 학파는 우주론적 결정론과 인간의 자유 의지와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 일치하는 의지를 유지하는 것이 도덕적이라는 가르침에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자신의 철학을 생활의 방법으로 여겼고, 말보다 행동이 개인의 철학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했다.[81]
세네카나 에픽테토스와 같은 후기 스토아 학파는 "덕은 행복으로 인해 완전해진다"고 믿었고, 지혜로운 사람은 불행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스토아적 침착함"이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80]
헬레니즘 시대 이후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 스토아 학파는 아카데메이아 학파, 소요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와 함께 4대 학파로 여겨졌다. 스토아 학파의 사상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을 통해 널리 퍼졌으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도 스토아 학파를 신봉했다. 그러나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철학의 이교적인 성격을 기독교의 교리와 맞지 않는다고 여겨 모든 학파를 폐지했다.[82][83]
많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일신교와 유사한 다신교적인 일신교를 믿었다.[84] 스토아 학파나 영향을 받은 중기·후기 플라톤주의는 이교의 일신교(pagan monotheism영어)로 분류되기도 한다.[97]
2. 1. 초기 스토아 학파 (기원전 3세기)

기원전 301년경 키티온의 제논이 스토아 포이킬레(채색된 주랑)에서 철학을 가르치면서 초기 스토아 학파가 시작되었다.[92] 제논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달리 아테네의 아고라같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철학을 설파했다.
제논의 사상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안티스테네스를 시조로 하는 견유학파의 사상에서 발전했다. 크리시포스는 제논의 제자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오늘날 스토아주의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초기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 학파를 창설한 시기부터 안티파트로스까지를 포함한다. 이 시기 스토아 철학자들의 저작은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지 않다.[93]
2. 2. 중기 스토아 학파 (기원전 2세기 ~ 기원전 1세기)
로도스의 파나이티오스(기원전 185년 – 기원전 109년)와 아파메이아의 포세이도니오스(기원전 135년경 – 기원전 51년)를 포함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스토아 학파는 아테네에서 로마로 활동 무대를 옮겼으며, 파나이티오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아시아의 신흥 무역 도시 출신 셈계 사람들이었다.
2. 3. 후기 스토아 학파 (1세기 ~ 2세기)
세네카,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기(1세기~2세기)를 후기 스토아 학파라고 부른다.[127] 후기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적극적인 참여자인 우주 안에서 조화로운 삶을 장려하는 데 집중했다.학자들은[15] 스토아주의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누는데, 그 중 세 번째 단계가 무소니우스 루푸스, 세네카,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포함하는 후기 스토아 시기이다. 스토아주의의 처음 두 단계에서는 완전한 저작물이 남아 있지 않고, 후기 스토아 시대의 로마 텍스트만 남아 있다.[16]
세네카나 에픽테토스와 같은 후기 스토아 학파는 "덕은 행복으로 인해 완전해진다"는 신념에서, 지자는 불행에 동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상은 "스토아적 침착함"이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에 가깝다.[80]
후기 스토아 학파의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스토아 학파는 학문을 자연학, 논리학, 윤리학의 세 가지로 분류하며, 이들은 논리학을 통해 상호 연결된다고 보았다. 후기로 가면서 윤리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스토아 학파는 윤리학에서는 키니코스 학파, 자연학에서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영향을 받았지만, 여러 요소가 절충되어 특정 학파에 한정하기는 어렵다.
3. 철학 체계
스토아 학파는 논리학, 일원론적 물리학, 자연주의적 윤리관을 통해 세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했다. 윤리학을 인간 지식의 주요 초점으로 강조했지만, 후대 철학자들은 논리 이론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스토아 철학은 파괴적인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 통제와 강인함을 기르고, 명확하고 편견 없는 사고를 통해 보편적 이성(''로고스'')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스토아 철학의 주요 목표는 개인의 윤리적, 도덕적 행복을 개선하는 것이며, "덕은 자연과 일치하는 의지로 구성된다."[5] 이 원칙은 대인 관계에도 적용되어 "분노, 시기심, 질투심에서 벗어나고",[6] 모든 사람이 자연의 산물이기에 노예도 동등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7]
스토아 윤리는 결정론적 관점을 옹호한다. 클레안테스는 스토아적 덕이 부족한 사람을 "마차에 묶여 가는 개"에 비유했다.[5] 반면 덕을 가진 스토아 학파는 자신의 의지를 세상에 맞추어 "병들었지만 행복하고, 위험하지만 행복하고, 죽어가지만 행복하고, 망명했지만 행복하고, 불명예스러워도 행복하다"[6]라고 말하며, "완전히 자율적인" 개인의 의지와 "엄격하게 결정론적인 단일 전체"인 우주를 제시한다. 이 관점은 "고전 범신론"으로 묘사되었고, 바뤼흐 스피노자가 채택했다.[8]
스토아주의자들의 생각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현존 자료가 후기에 편중되어 있어 전기 및 중기 스토아 학파의 사상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몇몇 단편적인 자료와 후기에서도 전기에 가까운 키케로, 에픽테토스(저작을 남기지 않아 제자 아리아노스의 기록에 의존)의 사상에서 추측할 수밖에 없다.
3. 1. 논리학
스토아 학파는 학문을 자연학, 논리학, 윤리학으로 분류하는데, 이 중 논리학은 다른 학문들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스토아 철학은 체계적인 주장을 펼쳤으며, 덕을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들에게 덕은 논리학, 일원론적 물리, 자연주의적 윤리의 이상으로 구성되며, '합리적인 삶을 사는 것'에 필수적이다.[18][19]
디오도루스 크로누스는 제논의 스승 중 한 명으로, 명제 논리에 기반한 논리학 접근법을 처음 도입하고 발전시킨 철학자로 여겨진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 논리와는 다른 것이었다. 이후 크리시포스는 스토아 논리학 체계를 발전시켰으며, 여기에는 스토아 삼단논법이라는 연역 체계가 포함되었다. 20세기에 명제 논리에 기반한 중요한 논리학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스토아 논리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나타났다. 수잔 보브지엔은 크리시포스의 철학적 논리학과 고틀로프 프레게의 논리학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언급했다.[24]
보브지엔은 또한 크리시포스가 화행 이론, 문장 분석, 술어 유형, 문장 연결사, 부정, 분리, 조건문, 논리적 결과, 타당한 논증 형식, 연역 이론, 명제 논리, 양상 논리 등 오늘날 논리학이 다루는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 300권이 넘는 책을 썼다고 언급했다.[24]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들은 진리를 오류와 구별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감각 기관을 통해 마음에 전달된 인상(환상)을 판단하는 능력을 통해 참된 표상과 잘못된 표상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성을 통해 명확한 이해와 확신(카타렙시스)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확실하고 참된 지식(에피스테메)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3. 1. 1. 범주론
스토아 학파는 모든 존재(ὄντα)는 물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모든 사물(τινά)이 물질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25] 이들은 존재 외에도 시간, 장소, 공백,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것(sayable)과 같은 네 가지 무형체(asomata)를 인정했다.[26] 무형체는 단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보편자에게는 이러한 지위가 주어지지 않았다.[27]
스토아 학파는 아낙사고라스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물체가 뜨거운 것은 보편적인 열의 일부분이 그 물체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이들은 이 아이디어를 모든 우연적인 사건에 적용했다. 즉, 물체가 빨간색인 것은 보편적인 빨간색 신체의 일부분이 그 물체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스토아 학파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범주를 제시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의 행동, 생각, 반응이 우리 통제 안에 있다고 보았다. 엔키리디온의 첫 단락에서는 "세상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판단력, 동기 부여, 욕망, 그리고 혐오다. 요컨대, 우리 자신의 행위는 모두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설명하며, 우리에게 달려있거나 우리의 힘 안에 있는 공간을 제시한다.[28]
자크 브룬슈비그는 스토아 학파의 범주 사용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제시했다.[29]
3. 1. 2. 인식론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사용하여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실은 허위와 구별될 수 있으며, 비록 현실에서는 근사치만 얻을 수 있더라도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30]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감각은 끊임없이 외부 대상으로부터 파동을 받아 마음으로 전달하고, 마음속에서 상상력(환상)에 인상을 남긴다.[30]
마음은 이러한 인상을 판단(συγκατάθεσις, ''synkatathesis'')하여 승인하거나 거부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참된 표현과 허위 표현을 구별한다.[30] 어떤 인상은 즉시 동의를 얻지만, 다른 인상은 망설이는 승인 정도에 머무르며, 이를 믿음 또는 의견 (''doxa'')이라고 부른다. 명확한 이해와 확신 (''katalepsis'')은 오직 이성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스토아 현자가 도달할 수 있는 확실하고 참된 지식 (''episteme'')은 동료의 전문 지식과 인류의 집단적 판단으로 확신을 검증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30]
3. 2. 자연학 (물리학)
스토아 학파는 학문을 자연학, 논리학, 윤리학으로 분류하고, 이 세 학문이 논리학을 통해 상호 연결된다고 보았다. 후기로 갈수록 윤리학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으며, 윤리학은 키니코스 학파, 자연학은 헤라클레이토스의 영향을 받았지만, 여러 요소가 절충되어 특정 학파에 한정 짓기는 어렵다. 스토아 학파는 전체론적 철학을 전개하여 우주의 물질적 구조에 대한 견해로부터 좋은 삶을 사는 방법을 이끌어냈고, 자연학과 윤리학을 통합하여 사고했다.[127]
스토아 학파는 세계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체이고, 불과 같이 미세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심지어 신조차도 물질이라고 생각했다. 세상 만물은 근원으로부터 생성과 회귀를 반복하며, 물체로서의 신이 우주 만물을 관철하여 순환하는 것이 섭리이고, 인간에게는 운명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신, 자연, 운명, 섭리는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닌다.
스토아 철학에서 우주는 신이고, 신이 곧 우주이다. 만물은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능동적인 신과 수동적인 인간 및 사물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인간의 인식 작용도 감각에서 비롯되며, 인간은 우주라는 큰 도시의 시민(코스모폴리티스)이다. 이는 유물론적 일원론이라는 전체론적 관점을 보여준다.
스토아 철학은 우주에서 작용하는 근원적 물체(신)를 프네우마(숨, 정신), 즉 천상의 불(불 같은 숨)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숨이 생명에 필수적이고, 불이 천상과 관련 있다는 삼단 논법으로 설명된다.[127] 이는 영혼과 불을 연결하는 헤라클레이토스 철학과 유사하며, 우주 만물에 신이 내재한다는 범신론적 성격을 보인다. 그러나 이는 스토아 학파의 유물론적 일원론과 모순되기도 하여, 후기 스토아 철학에서는 유심론 성향이 강해진다.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우주는 물질적인 이성적인 본질(''로고스'')이며,[31] 소극적인 물질과 적극적인 지적 에테르 또는 원시적인 불로 나뉜다.[32]
모든 것은 운명의 법칙에 종속되며, 인간과 동물의 영혼은 원시적인 불에서 발산되어 운명에 종속된다. 개별적인 영혼은 "우주의 ''정자적 이성'' ("로고스 스페르마티코스") 안으로 들어가 불의 본성을 띠며 전이되고 확산될 수 있다".[33] 올바른 이성은 인간과 우주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스토아 신학은 숙명론적이고 자연주의적 범신론이다. 신은 내재하며, 자연과 동일시된다. 아브라함 계통 종교와 달리, 스토아 철학은 신을 우주의 전체와 동일시한다. 스토아 우주론은 힌두교적 존재론과 유사하게, 시간은 무한하고 순환적이며, 공간과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이 순환한다고 본다. 현재의 우주는 파괴와 재창조를 반복하는 무한한 우주들 중 하나이다. (영원 회귀 참조).[34]
스토아 철학은 우주에 시작이나 끝을 가정하지 않으며,[35] ''로고스''는 우주에 스며들어 생기를 불어넣는 적극적인 이성 또는 ''아니마 문디''로, 물질적인 신 또는 자연과 동일시된다고 보았다. 또한 ''정자적 이성'' ("로고스 스페르마티코스")은 무생물 물질에서 작용하는 생성 법칙이며, 인간은 신성한 ''로고스''의 일부를 소유한다.[36]
스토아 학파는 세계가 물질적이며, 신 혹은 자연으로 알려진 이성적인 실체이고, 능동적·수동적 두 종류로 나뉜다고 보았다.[97] 수동적인 실체는 물질이며, 능동적인 실체는 운명 또는 보편적인 이성(로고스)이라 불리는 지적인 에테르 즉, 원초의 불이다.[98]
만물이 운명의 법칙에 따르는 것은 세계가 자신의 본성과 일치해서만 활동하며, 수동적인 물질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인간이나 동물의 영혼은 이 원초의 불로부터 유출되어 운명에 따른다. 개개의 영혼은 "세계의 씨앗인 이성(''logos spermatikos'')에 받아들여짐으로써 불의 본성을 띠고, 변화·확산될[99]" 수 있다. 올바른 이성이 인간과 세계의 기초이므로, 인생의 목적은 이성, 즉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이 된다.
스토아 학파의 신학은 일신교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84][97]
3. 2. 1. 우주론
스토아 학파는 우주 전체가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물질은 능동적인 신과 수동적인 인간 및 사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이들은 신, 자연, 운명, 섭리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다.[127] 즉, 우주가 곧 신이고, 신이 곧 우주라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에서 우주의 근원 물질은 프네우마(숨, 정신)라고 불리는 천상의 불이다.[127] 이는 숨이 생명에 필수적이고, 불이 천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삼단 논법을 통해 도출된 개념이다. 이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과 유사하며, 범신론적인 성격을 띤다. 후기 스토아 철학은 이러한 유심론적 경향이 더욱 강해진다.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우주는 물질적인 이성적인 본질(''로고스'')이며,[31] 소극적인 물질과 적극적인 지적 에테르 또는 원시적인 불로 나뉜다.[32]
모든 것은 운명의 법칙에 종속되며, 인간과 동물의 영혼은 원시적인 불에서 발산되어 운명에 종속된다.
개별적인 영혼은 "우주의 ''정자적 이성'' ("로고스 스페르마티코스") 안으로 들어가 불의 본성을 띠며 전이되고 확산될 수 있다".[33] 올바른 이성은 인간과 우주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스토아 신학은 숙명론적이고 자연주의적 범신론이다. 신은 내재하며, 자연과 동일시된다. 아브라함 계통 종교와 달리, 스토아 철학은 신을 우주의 전체와 동일시한다. 스토아 우주론은 힌두교적 존재론과 유사하게, 시간은 무한하고 순환적이며, 공간과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이 순환한다고 본다. 현재의 우주는 파괴와 재창조를 반복하는 무한한 우주들 중 하나이다. (영원 회귀 참조).[34]
스토아 철학은 우주에 시작이나 끝을 가정하지 않으며,[35] ''로고스''는 우주에 스며들어 생기를 불어넣는 적극적인 이성 또는 ''아니마 문디''로, 물질적인 신 또는 자연과 동일시된다고 보았다. 또한 ''정자적 이성'' ("로고스 스페르마티코스")은 무생물 물질에서 작용하는 생성 법칙이며, 인간은 신성한 ''로고스''의 일부를 소유한다.[36]
스토아 학파는 세계가 물질적이며, 신 혹은 자연으로 알려진 이성적인 실체이고, 능동적·수동적 두 종류로 나뉜다고 보았다.[97] 수동적인 실체는 물질이며, 능동적인 실체는 운명 또는 보편적인 이성(로고스)이라 불리는 지적인 에테르 즉, 원초의 불이다.[98]
만물은 운명의 법칙에 따르며, 인간이나 동물의 영혼은 원초의 불로부터 유출되어 운명에 따른다. 개개의 영혼은 "세계의 씨앗인 이성(''logos spermatikos'')에 받아들여짐으로써 불의 본성을 띠고, 변화·확산될[99]" 수 있다. 올바른 이성이 인간과 세계의 기초이므로, 인생의 목적은 이성, 즉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이 된다.
프레데릭 브렌크는 스토아 학파가 우주의 로고스나 헤게몬콘(이성이나 지도 원리)과 동일한 신을 믿고, 전통적인 신들을 격하시켰지만, 이 하나의 신에 대한 숭배를 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97]
3. 2. 2. 신학
스토아 학파는 우주의 물질적 구조에 대한 견해로부터 좋은 삶을 사는 방법을 이끌어냈다. 그들은 자연학과 윤리학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고했다.[127]
스토아 학파는 이 세계(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체이고, 불과 같이 미세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심지어 신조차도 인간이나 자연과 마찬가지로 물질이라고 생각했다. 세상 만물은 이 근원으로부터 생성되었다가 회귀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마치 꿀이 벌집 속으로 번져나가듯, 물체로서의 신이 우주 만물을 관철하여 순환하는 것이 섭리이고, 이는 인간 측면에서 보면 운명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신, 자연, 운명, 섭리는 동의어이다.
스토아 철학에서 우주는 신이고, 신이 우주이다. 우주 만물은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만,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것(신)과 수동적으로 작용받는 것(인간, 사물)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인간 인식 작용의 원천도 감각(물체로부터 오는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에서 구하고, 인간도 우주라는 큰 도시의 시민(코스모폴리티스)이라고 주장한다. 전체론적 관점, 즉 유물론적 일원론을 구사하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은 우주에서 작용하는 근원적 물체(신)을 프네우마(pneuma, 숨, 정신), 즉 천상의 불(불 같은 숨)이라고 했다. 이는 삼단 논법으로 구성된다. (1) 숨은 생명에 본질적이다. 죽으면 숨쉬기를 멈추기 때문이다. (2) 숨이 생명의 원리이고, 생명의 근원이 신이라면, 신은 특별한 종류의 생명 원리일 것이다. (3) 불은 천상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신은 천상의 불 같은 숨이다.[127]
이러한 주장은 영혼과 불을 연결하는 헤라클레이토스 철학과 유사하다. 프네우마는 온 우주에서 사물과 뒤섞인다. 따라서 우주 만물에는 신이 내재한다. 이는 일종의 범신론으로, 스토아 학파의 출발점인 유물론적 일원론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후기로 접어들면서 스토아 철학은 점차 이런 유심론 성향이 짙어진다.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우주는 물질적인 이성적인 본질(''로고스'')의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31] 소극적인 본질은 물질로서 "무기력하게 놓여 있으며, 어떤 용도에도 적합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 확실히 사용되지 않을 본질"이다.[32] 적극적인 본질은 지적인 에테르 또는 원시적인 불로서, 소극적인 물질에 작용한다.
모든 것은 운명의 법칙에 종속되며, 우주는 자체의 본성과 그것이 지배하는 소극적인 물질의 본성에 따라 작용한다. 인간과 동물의 영혼은 이 원시적인 불에서 발산된 것이며, 마찬가지로 운명에 종속된다.
개별적인 영혼은 본질적으로 덧없이 사라지며, "우주의 ''정자적 이성'' ("로고스 스페르마티코스") 안으로 들어가 불의 본성을 띠며 전이되고 확산될 수 있다".[33] 올바른 이성은 인간과 우주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스토아 신학은 숙명론적이고 자연주의적 범신론이다. 신은 결코 완전히 초월적이지 않고 항상 내재하며, 자연과 동일시된다. 아브라함 계통 종교는 신을 세계를 창조하는 실체로 인격화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신을 우주의 전체와 동일시한다. 스토아 우주론에 따르면, 이는 힌두교적 존재론과 매우 유사하며, 시간에는 절대적인 시작이 없으며 무한하고 순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마찬가지로 공간과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으며, 오히려 순환적이다. 현재의 우주는 현재 주기의 한 단계이며, 그 앞에는 무한한 수의 우주가 있었고, 파괴될 운명이며 ("불태움", ''대화재'') 다시 재창조될 운명이며,[34] 또 다른 무한한 수의 우주가 뒤따를 것이다. 스토아 철학은 모든 존재를 순환적인 것으로, 코스모스를 영원히 스스로 창조하고 스스로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영원 회귀 참조).
스토아 철학은 우주에 시작이나 끝을 가정하지 않는다.[35]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로고스''는 전체 우주에 스며들어 생기를 불어넣는 적극적인 이성 또는 ''아니마 문디''였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신 또는 자연과 동일시된다. 스토아 학파는 또한 ''정자적 이성'' ("로고스 스페르마티코스"), 즉 무생물 물질에서 작용하는 적극적인 이성의 원리인 우주의 생성 법칙을 언급했다. 인간 역시 우주를 제어하고 유지하는 원시적인 불과 이성인 신성한 ''로고스''의 일부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36]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세계는 물질적이며, (하나의) 신 혹은 자연으로 알려진 이성적인 실체이며, 능동적·수동적 두 종류로 나뉜다.[97] 수동적인 실체는 물질이며, "무엇에든 쓸 수 있는 실체이지만 비활성이며, 누군가에 의해 운동을 가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은 채로 있다[98]" 운명 또는 보편적인 이성(로고스)이라 불리는 능동적인 실체는 지적인 에테르 즉, 원초의 불이며, 수동적인 물질에 작용한다.
만물이 운명의 법칙에 따르는 것은 세계가 자신의 본성과 일치해서만 활동하며, 수동적인 물질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인간이나 동물의 영혼은 이 원초의 불로부터의 유출물이며, 마찬가지로 운명에 따른다.
개개의 영혼은 그 본성상 멸망해가는 것이며, "세계의 씨앗인 이성(''logos spermatikos'')에 받아들여짐으로써 불의 본성을 띠고, 변화·확산될[99]" 수 있다. 올바른 이성이 인간과 세계의 기초이므로, 인생의 목적은 이성에 따라 사는 것, 즉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이 된다.
스토아 학파의 신에 대해 프레데릭 브렌크는 이렇게 적고 있다.
스토아 학파의 신학은 일신교로 분류되기도 한다.[84][100][101][97] 스토아 학파는 기독교도가 천사, 성인과 같은 신성(divine) 혹은 신(god)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를 가지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신을 특정 신(God 혹은 the God)이라고 부르고, 그 특정 신을 제외한 신들에게는 최고신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제보다 훨씬 더 철저한 종속 관계(파생 관계)를 가지게 했다고 생각된다.[102] 그들은 단순한 최고신이 아니라 '특정 신(the God)', 그만이 신이라고 부를 가치가 있는 유일무이한 신인 것처럼 특별한 명칭을 사용했다.[102]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제우스만이 신이 되기 위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며, 다른 신들은 제우스에 의해 운명 지어져, 제우스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며, 신들은 완전히 제우스(the God)에게 의존하며, 불멸조차 아니었다.[103]
3. 3. 윤리학
스토아 학파는 학문을 자연학, 논리학, 윤리학의 세 가지로 분류했지만,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후기로 갈수록 윤리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스토아 학파는 윤리학에서는 키니코스 학파를 따르고 자연학에서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영향을 받았지만, 여러 요소를 절충하여 특정 학파와 깊게 관련짓기는 어렵다.[127]
스토아 학파는 좋은 삶과 그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자연학을 윤리학과 연결하려 했다. 이들은 외적 권위나 세속적인 것을 거부하고 금욕과 극기를 통해 이를 얻으려 했다. 이러한 특징은 폴리스가 아닌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거대 제국이나 로마 제국에서 살았던 시대적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개인은 생존 근거를 추상적 공론이나 정치, 사회 현실보다 자기 의지나 감각을 통해 얻는 사실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127]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신은 이성(logos)적이며, 이는 인간이 바라는 최고의 능력이다. 신은 우주 어디에나 존재하므로 우주 역시 이성적이다. 인간의 영혼에도 신(프네우마)이 깃들어 있기에, 이성을 통해 영혼을 신성에 가깝게 할 때 궁극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127]
하지만 인간은 비이성적 요소에 휘둘리기 쉽다. 스토아 학파는 통제력을 그 원인으로 보았다. 걷는 사람은 자기 의지로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뛰는 사람은 통제력이 약하다. 이처럼 이성은 다양한 모습을 띨 수 있다. 우리는 신성한 자연 세계와 조화로운 삶을 택해 이성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도, 그 반대로 살 수도 있다. 즉,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127]
스토아 학파는 자기 점검과 자기 배려를 필수적인 것으로 여겼다. 외부 상황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우리 자신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에 집중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자기 절제(금욕주의)를 강조했다.[127]
신의 섭리(우주 법칙)와 인간 선택의 충돌 문제에 대해, 스토아 학파는 신은 우주 만물에 스며든 프네우마이므로 신의 법칙, 즉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목적론적, 결정론적 세계관과 연결된다. 스토아 학파는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했다.[127]
긴 줄로 수레에 묶인 개는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할 운명이다. 하지만 개는 이성에 조화롭게 기꺼이 이동할 수도, 저항하며 괴롭게 이동할 수도 있다. 선택은 개에게 달려 있다. 좋은 삶은 이성(운명, 섭리, 신)과 조화를 이루며 이성적(윤리적)으로 살아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주의 큰 흐름에 순응하여 조화롭게 살고자 주체적·적극적 태도로 노력하는 덕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127]
스토아 학파에서 덕은 오이케이오시스(oikeiosis, 전유)를 통해 길러진다. 오이케이오시스란 자기 바깥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다.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여 자기 것으로 삼을 때, 건강, 재산, 지위, 평판 등이 아닌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선을 선택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목표의 옳고 그름 자체이다.[127]
스토아 학파는 자기 행복뿐 아니라 만물의 프네우마 공유를 통한 신적 섭리의 보편성을 믿었다. 따라서 인류 전체를 이롭게 하려는 더 큰 소망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했다. 세계 가족의 행복 증진 의무는 세계 시민 의식과 만민법 사상으로 발전했다.[127]
3. 3. 1. 정념 (파토스)
스토아 학파에게 이성은 논리를 사용하고 자연의 과정, 즉 모든 사물에 내재된 로고스 또는 보편적 이성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했다.[37] 그리스어 단어 ''파토스''는 사람이 겪는 고통을 나타내는 광범위한 용어였다.[38] 스토아 학파는 이 단어를 분노, 공포, 과도한 기쁨과 같은 많은 일반적인 감정을 논의하기 위해 사용했다.[39] 정념은 올바르게 추론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정신의 혼란스럽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힘이다.[38]
스토아 학파의 크리시포스에게 정념은 평가적 판단이다.[40] 그러한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은 무관심한 것을 잘못 평가한 것이다.[41] 선과 악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같은 판단의 오류가 각 정념의 근본에 놓여 있다.[42] 현재의 선에 대한 잘못된 판단은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욕망은 미래에 대한 잘못된 평가이다.[42] 악에 대한 비현실적인 상상은 현재에 대한 고통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한다.[42] 이상적인 스토아 학파는 대신 사물의 진정한 가치를 측정하고,[42] 정념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다.[43] 정념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족적인 행복을 갖는 것이다.[43]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부정적인 사고만이 유일한 악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해칠 수 없으므로 분노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43]
스토아 학파는 정념을 고통, 쾌락, 공포, 욕망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44]
이러한 정념 중 두 가지(고통과 기쁨)는 현재 존재하는 감정을, 나머지 두 가지(공포와 욕망)는 미래를 향한 감정을 나타낸다.[44] 따라서 선과 악의 가능성에 대한 두 가지 상태가 있으며, 현재인지 미래인지에 따라 세분된다.[45] 같은 종류의 수많은 하위 분류가 별도의 정념 아래에 포함되었다.[46]
- '''고통''': 질투, 경쟁, 시기심, 연민, 불안, 애도, 슬픔, 괴로움, 비탄, 통곡, 우울증, 짜증, 절망.
- '''공포''': 무기력, 수치심, 공포, 소심함, 경악, 비겁, 당황, 그리고 낙담.
- '''욕망''': 분노, 격노, 증오심, 적대감, 분노, 탐욕, 그리고 갈망.
- '''기쁨''': 악의, 황홀경, 그리고 과시.
현자(''sophos'')는 정념에서 자유로운 사람(''무정념'')이다. 대신 현자는 맑은 정신을 가진 좋은 감정(''eupatheia'')을 경험한다.[47] 이러한 감정적 충동은 과도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감소된 감정도 아니다.[48][49] 대신 그것들은 올바른 이성적 감정이다.[49] 스토아 학파는 좋은 감정을 기쁨(''chara''), 의지(''boulesis''), 그리고 조심(''eulabeia'')의 범주로 분류했다.[41] 따라서 진정한 선이 존재하는 경우, 현자는 영혼의 고양을 경험한다—기쁨(''chara'')[50] 스토아 학파는 또한 좋은 감정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했다.[51]
- '''기쁨:''' 즐거움, 쾌활함, 좋은 정신
- '''의지:''' 선의, 호의, 환영, 소중히 여김, 사랑
- '''조심:''' 도덕적 수치심, 존경
현대에서 "스토익"이라는 단어는 "비감정적" 또는 고통에 무관심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가 감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학파로 종종 오해받는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어에서 "정동"의 의미는 "고뇌" 또는 "고통"[104], 즉 외적인 사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새겼다는 점에서 현대의 용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발생한 오해이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이성"에 따르는 것으로 "정동"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설파했을 뿐, 감정을 없애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명확한 판단과 내적인 정적을 가져다줄 수 있는 단호한 아스케시스를 통해 감정을 변질시키려 했다[105]. 내성, 전념, 논리적 사고 등이 그러한 자기 수양 방법으로 여겨졌다. 또한 스토아 학파는 선행하는 키니코스 철학의 논리를 밟아, 선은 영혼 자체 내부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정동" 즉 본능적인 반응 (예: 육체적인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을 떠는 것)을 일반적으로 번역하는 "파토스"와, 스토아 학파의 지자(소포스)의 표징인 "에우파토스"가 구별되었다. 정동이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판단에서 생겨나는 감정이 "에우파테이아"이다.
그 사상은 아파테이아 (, 마음의 평안)를 통해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것으로,[106] 여기에서 마음의 평안은 고대적인 의미로 이해된다. 즉, 객관적이며 인생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평정과 명확한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다.
영원한 평정 상태, 즉 모든 감정에서 해방된 상태를 영혼의 안정으로 여기고 최고의 상태로 추구한다. 아파테이아( ἀπάθειαel/apatheia, 어원적으로는 파토스pathos에 부정 접두사 "a"가 붙음)라고 불리는 이 경지는 현자가 도달해야 할 목표이자 스토아 학파에서 최고의 행복이었다. 당연히 죽음에 임하는 공포나 불안도 극복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상으로 소크라테스의 최후가 자주 거론된다. 분노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으며, 그저 당연한 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3. 3. 2. 덕과 행복
스토아 학파는 윤리학을 인간 지식의 주요 초점으로 삼았으며, 덕은 자연과 일치하는 의지로 구성된다고 보았다.[5] 이들은 자기 통제와 강인함을 길러 파괴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명확하고 편견 없는 사고를 통해 보편적 이성(로고스)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6]스토아 윤리는 결정론적 관점을 옹호하는데, 클레안테스는 덕이 부족한 사람은 "마차에 묶여 가는 개와 같아서, 마차가 가는 곳마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비유했다.[5] 반면, 덕을 가진 스토아 학파는 자신의 의지를 세상에 맞추어 조정하여,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병들었지만 행복하고, 위험하지만 행복하고, 죽어가지만 행복하고, 망명했지만 행복하고, 불명예스러워도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6]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신은 이성적(로고스)이며, 이성은 인간이 염원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다. 신은 우주 어디에나 존재하므로, 우주 역시 이성적이다. 인간의 영혼에도 신(프네우마)이 깃들어 있으므로, 이성을 활용해 영혼을 신성에 가깝게 할 때 궁극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127]
하지만 인간은 비이성적 요소들에 휘둘리기 쉽다. 스토아 학파는 그 원인을 통제력에서 찾았다. 걷는 사람은 자기 의지로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뛰는 사람은 통제력이 약하다. 이처럼 이성은 건강한 상태와 병든 상태 사이에서 다양한 모습을 띨 수 있다. 우리는 신성한 자연 세계와 조화로운 삶을 택해 이성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도, 그 반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즉,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127]
스토아 학파는 자기 점검과 자기 배려를 필수적인 것으로 여겼다. 재산, 권력, 출신, 신분 등 외부 상황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므로,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즉 우리 자신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에 집중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기 절제(금욕주의)를 강조했다.[127]
스토아 학파에서 덕은 오이케이오시스(oikeiosis, 전유)를 통해 길러진다. 오이케이오시스란 자기 바깥에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일이다. 사람은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분별하고 선택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데, 이때 선택해야 할 것은 건강, 재산, 지위, 평판 등이 아니라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선이다. 중요한 것은 목표로 삼은 것이 올바르냐 그르냐 하는 사실 그 자체였다.[127]
스토아 학파는 신적 섭리의 보편성을 믿었다. 만물이 프네우마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자식, 가족, 친구만을 이롭게 하려는 본능적 성향은 자연스레 인류 전체를 이롭게 하려는 더 큰 소망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했다. 세계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 이러한 세계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는 일이 만인의 의무라는 생각은 후대에 세계 시민 의식과 만민법 사상으로 발전했다.[127]
스토아 학파는 "덕은 행복으로 인해 완전해진다"는 신념을 가졌으며, 지자는 불행에 동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스토아적 침착함"이라는 말에 가깝지만, 지자는 진정으로 자유로우며 모든 도덕적 부패는 똑같이 악덕이라는 과격 윤리적인 사상을 함의하지 않는다.[80]
스토아 학파는 아파테이아(ἀπάθεια, 내면의 평화)를 통해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추구했다.[106] 여기서 마음의 평안은 객관적이며, 인생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평정과 명확한 판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이성에 따르는 것으로 정동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단호한 금욕주의를 통해 감정을 변질시키려 했다.[105]
3. 3. 3. 오이케이오시스 (Oikeiosis)
오이케이오시스(oikeiosis, 전유)는 자기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스토아 학파에서 덕은 오이케이오시스를 통해 길러진다. 사람은 자기 바깥에 있는 사물 또는 일에 대해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분별하고 선택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다. 이때 건강, 재산, 지위, 평판 등이 아니라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선을 선택해야 한다. 그 절대적 선에 실제로 도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목표로 삼은 것이 올바른지 그른지 하는 사실 그 자체이다.[127] 예를 들어, 불이 난 집에서 아이를 구출하려 할 때, 아이를 구하는 것은 그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는 것이 덕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구하면 더 좋겠지만, 실제로 아이를 구했는지는 궁극적 관점에선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더 중요하다.스토아 학파는 자기 행복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신적 섭리의 보편성을 믿었는데, 만물이 프네우마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자식, 가족, 친구만을 이롭게 하려는 우리의 본능적 성향은 자연스레 인류 전체를 이롭게 하려는 더 큰 소망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했다. 세계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 이러한 세계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는 일이 만인의 의무라는 생각은 후대에 세계 시민 의식과 만민법 사상으로 발전했다.[127]
3. 3. 4. 자살
스토아 학파는 현명한 사람이 미덕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 심한 고통이나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에 자살을 허용했다.[52]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자살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의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53] 예를 들어, 플루타르코스는 카토가 폭정 아래에서 삶을 받아들였다면 스토아 학파로서의 자기 일관성(constantia)을 훼손하고 명예로운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해쳤을 것이라고 전한다.[54]스토아 학파는 자신의 목숨을 가볍게 여겼지만, 인간 각자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자유 의지는 전면적으로 존중하여 타인에 대한 살인은 긍정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다른 철학처럼 적에 맞서 용맹하게 싸우는 것은 선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생각은 "영혼은 신으로부터 빌린 것일 뿐"이라는 말에 단적으로 나타난다.
아디아포라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은 선이 아니라 "바람직한 것"일 뿐이므로, 상황에 따라(사지 절단, 심한 노령, 부당한 명령에 따라야 하는 등) 자살도 긍정했다.
이에 반해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형식적으로" 자유의 표현일 뿐이며, "자유의 존립 기반" 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가장 부자유스러운 행위"라고 여긴다.[123] 그리고 개인의 육체는 "신에 의해 창조되어 존재하는 피조물"이므로, 개인은 자신의 육체를 자유롭게 파괴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여긴다.[124]
4. 사회 철학
스토아 철학의 두드러진 특징은 세계주의이다.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하나의 보편적인 정신의 발현이며, 서로 형제애를 가지고 기꺼이 서로를 도와야 한다. 에픽테토스는 그의 저서 ''담론''에서 인간과 세계의 관계에 대해 "각 인간은 우선 자신의 공동체의 시민이지만, 신과 인간의 위대한 도시에 속한 구성원이기도 하며, 정치적인 도시는 그 도시의 모방일 뿐이다."라고 언급했다.[55] 이러한 정서는 "나는 아테네 사람도, 코린토스 사람도 아닌, 세계의 시민이다."라고 말한 시노페의 디오게네스의 생각과 일치한다.[56]
스토아 학파는 계급과 부와 같은 외부적인 차이가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대신 인류의 형제애와 모든 인간의 자연적인 평등을 옹호했다. 스토아 철학은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파가 되었으며, 카토 (소 카토)와 에픽테토스와 같은 주목할 만한 작가와 인물을 배출했다.
특히 그들은 노예에 대한 관용을 촉구한 것으로 유명했다. 세네카는 "당신이 노예라고 부르는 사람도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같은 하늘 아래서 미소를 지으며, 당신과 동등한 조건으로 숨 쉬고, 살고,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권고했다.[57]
5. 영향
스토아 학파는 고대 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 종교,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127] 플로티노스는 플라톤을 스토아 학파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신플라톤주의의 기초를 확립했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는 스토아 학파의 입장을 원용하여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했다. 기독교 사상가들은 스토아 학파의 유물론적 관점은 부정했지만, 이원론, 우주에 신성이 스며 있다는 생각, 덕을 쌓아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 신정론(神正論) 등은 수용했다.[127]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는 "목소리는 기독교 주교지만, 훈계는 제논의 것"이라고 할 정도로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았다.[118][119] 사도바울은 아테네 체류 중에 스토아 학파와 만났으며, 그의 편지에서 스토아 학파의 용어와 비유를 사용하여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을 도왔다. 암브로시우스, 테르툴리아누스 등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의 저작에도 스토아 학파의 영향이 나타난다.
조르다노 브루노, 스피노자 등 근세 사상가들은 신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스토아 학파의 관점을 받아들였다. 몽테뉴와 같은 모랄리스트들은 후기 스토아 학파의 윤리 사상을 처세훈으로 삼아 널리 읽었다.
현대에는 명제 간의 관계를 다루는 스토아 학파의 논리학이 재평가되고 있으며, 심리학 분야에서는 인지 행동 치료가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았다. 인지 행동 치료는 모든 결정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에 따라 환자가 자신의 생각, 느낌,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127]
스탠퍼드 철학 백과사전은 "영어 형용사 'stoical'(스토아적인)이 그 철학적 기원에 대해 오해를 초래하는 일은 없다[126]"라고 언급한다. 현대 영어에서 "스토아적"이라는 단어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인내심을 가지고 고통을 견디는 사람을 뜻한다.[125]
5. 1. 고대
기원전 301년 초, 키티온의 제논이 아테네의 아고라 북면에 위치한 채색된 주랑(스토아 포이킬레)에서 철학을 가르치면서 스토아 학파가 시작되었다.[92] 제논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달리, 아고라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가르치는 것을 선택했다.제논의 사상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안티스테네스를 시조로 하는 견유학파에서 발전했다. 제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제자는 크리시포스로, 그는 오늘날 스토아주의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후기 로마 시대의 스토아주의는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스토아 학파의 역사는 세 단계로 나뉜다.
- 초기 스토아 학파: 제논의 학파 창설부터 안티파트로스까지.
- 중기 스토아 학파: 파나이티오스와 포세이도니오스를 포함.
- 후기 스토아 학파: 무소니우스 루푸스,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 등을 포함.
초기 스토아 학파의 저작은 현재 남아있지 않으며, 후기 스토아 학파 로마인들의 저작만이 전해진다.[93]
스토아 학파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을 강조했다. 이들은 모든 인류가 보편적인 영혼의 현현이며, 형제애로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에픽테토스는 『어록』에서 인간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신과 인간의 위대한 국가의 일원이라고 말했다.[115] 시노페의 디오게네스는 자신을 아테네인이나 코린토스인이 아닌 세계 시민이라고 칭했다.[116]
스토아 학파는 계급이나 재산과 같은 외적인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인류의 형제애와 본질적인 평등을 강조했다. 이들은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학파였으며, 카토나 에픽테토스와 같은 인물들을 배출했다.
특히 스토아 학파는 노예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장려했다. 세네카는 노예도 같은 근원에서 태어나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므로 자비롭게 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117]
5. 2. 중세 및 르네상스
플로티노스는 플라톤을 스토아 학파 관점에서 해석하여 신플라톤주의의 기초를 확립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나 오리게네스는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하는 데 스토아 학파의 입장을 원용했다. 기독교 사상가들은 스토아 학파의 유물론적 관점은 부정했지만, 우주에 신성이 스며 있다는 생각, 인간은 덕을 쌓아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믿음은 받아들였다. 또한 스토아 학파의 신정론(神正論)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127]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는 "목소리는 기독교 주교의 목소리지만, 훈계는 제논의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았다.[118][119] 사도바울은 아테네 체류 중에 스토아 학파와 만났으며, 그의 편지에서 스토아 학파의 용어와 비유를 사용하여 기독교 이해를 도왔다. 암브로시우스, 마르쿠스 미누시우스 펠릭스, 테르툴리아누스의 저작에도 스토아 학파의 영향이 나타난다.
스토아주의는 교부들에 의해 "이교 철학"으로 간주되었지만,[82][83] 로고스, 덕, 영혼, 양심과 같은 핵심적인 철학적 개념은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이 이용했다.[121]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과 같은 스토아 학파의 저작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높이 평가되었다.
유스투스 리프시우스는 고대 스토아 철학을 기독교에 적합한 형태로 부활시키려 했고, 프란시스코 데 케베도는 『스토아 학파의 교리』(1635년)를 출판하며 스토아 학파와 기독교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을 계속했다.[122]
5. 3. 근대
플로티노스는 플라톤을 스토아 학파 관점에서 해석하여 신플라톤주의의 기초를 확립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나 오리게네스는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하는 데 스토아 학파의 입장을 원용했다.[127]조르다노 브루노, 스피노자의 사상 등 근세에도 신과 자연을 동일시하려는 스토아 학파의 관점은 큰 역할을 수행했다. 후기 스토아 학파의 윤리 사상은 몽테뉴 등의 모랄리스트들에게 일종의 처세훈으로 애독됐다.[127]
유스투스 리프시우스는 고대 스토아 철학을 기독교에 적합한 형태로 부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을 발표했고, 1600년에 출판된 에픽테토스의 판 편집자로서, 프란시스코 산체스 데 라스 브로자스가 스페인에서 스토아주의를 추진했다. 그 후 프란시스코 데 케베도가 『스토아 학파의 교리』(1635년)를 출판하며 스토아 학파와 기독교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을 계속했다.[122]
5. 4. 현대
스토아 학파는 고대 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 종교, 문학 등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127] 플로티노스는 신플라톤주의의 기초를 확립하면서 플라톤을 스토아 학파 관점에서 해석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는 스토아 학파의 입장을 원용하여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했다. 기독교 사상가들은 스토아 학파의 유물론적 관점은 부정했지만, 이원론, 우주에 신성이 스며 있다는 생각, 덕을 쌓아 신과 하나가 되려는 노력, 신정론(神正論) 등은 수용했다.[127]근세에는 조르다노 브루노, 스피노자 등의 자연 사상에서 신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스토아 학파의 관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후기 스토아 학파의 윤리 사상은 몽테뉴 등 모랄리스트에게 처세훈으로 널리 읽혔다.
현대에는 명제 간의 관계를 다루는 스토아 학파의 논리학이 재평가되고, 심리학 분야에서는 인지 행동 치료가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았다. 인지 행동 치료는 결정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에 따라 환자가 생각, 느낌,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127]
스탠퍼드 철학 백과사전은 "영국 형용사 '스토아적'의 의미는 철학적 기원과 무관하지 않다"고 언급한다.[62] 현대 영어에서 "스토아적"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인내심을 가지고 고통을 견디는 사람을 뜻한다.[61]
20세기에 스토아 학파는 A. A. 롱의 ''스토아 철학의 문제''[63][64] 출판(1971년)과 덕 윤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시 주목받았다. 현대 스토아 학파 운동은 고대 스토아 철학 연구 증가와 앨버트 엘리스[65]의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애런 T. 백의 인지 행동 치료 연구에 기반한다.
스토아 철학은 앨버트 엘리스의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REBT)를 통해 현대 인지 행동 치료법(CBT)에 철학적 영감을 주었다. 애런 T. 백 등의 우울증 인지 치료 매뉴얼은 "인지 치료의 철학적 기원은 스토아 철학자"라고 명시한다.[66] 엘리스는 내담자들에게 ''에픽테토스의 엔키리디온''의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판단이 우리를 화나게 한다"는 인용구를 가르쳤다.[67]
폴 찰스 뒤부아는 스토아 철학에 의존하여 "합리적 설득" 학파를 창시하고, 내담자들에게 세네카 구절 공부를 권장했다. 현대 스토아 철학과 CBT의 유사성이 제안되었고, 우울증 치료 효능 보고도 발표되었다.[68] 스토아 철학 원리를 환경 교육,[70] 채식주의,[71] 지속 가능한 개발[72][73][74] 등 현대 문제에 적용하려는 관심도 있었다.
셰이머스 맥 스윈은 스토아 영적 훈련이 성찰적 실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75] 피에르 아도에 따르면, 스토아 철학은 단순 신념 체계가 아니라, 끊임없는 실천과 훈련(아스케시스)을 포함하는 삶의 방식이다. 에픽테토스는 ''담화집''에서 판단, 욕망, 성향의 세 가지 행위를 구분했고,[76] 아도는 이를 논리, 물리학, 윤리와 동일시했다.[77]
루키우스 안나에우스 세네카와 에픽테토스는 "덕은 행복으로 완전해진다"며 지자는 불행에 동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스토아적 침착함"에 가깝지만, 모든 도덕적 부패는 똑같이 악덕이라는 "과격 윤리적" 사상을 함의하지 않는다.[80]
스토아 학파는 헬레니즘 시대 이후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 아카데메이아 학파, 소요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와 함께 4대 학파였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도 신봉했으나,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철학의 이교적 성격을 기독교 교리와 조화되지 않는다고 여겨 폐지했다.[82][83]
스토아 학파라는 이름은 제논이 아테네 아고라의 채색된 주랑 (스토아 포이킬레)에서 가르쳤던 것에서 유래한다.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는 "목소리는 기독교 주교지만, 훈계는 제논의 것"이라 했다.[118][119] 클레안테스는 제논의 "창조의 불"을 프네우마 ("정신")로 표현했는데, 이는 기독교 "성령"과 연결된다.[120] 삼위일체 교리 역시 스토아 학파의 신의 통일성 명칭에서 맹아를 찾을 수 있다.[120]
사도바울은 아테네에서 스토아 학파와 만났고(사도행전 17:16-18), 편지에서 스토아 철학 지식을 활용해 기독교 이해를 도왔다. 스토아 학파 영향은 암브로시우스, 테르툴리아누스 등 저작에도 나타난다.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적 입장을 취해 신은 내재적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세계를 창조하는 인격적 신을 믿는 기독교와 대립한다. 또한, 스토아 학파는 기독교와 달리 세계의 시작과 끝을 설정하지 않는다.[121]
스토아주의는 교부들에게 "이교 철학"으로 간주되었지만,[82][83] "로고스", "덕", "영혼", "양심" 등 핵심 개념은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이 이용했다.[121] 스토아주의와 기독교는 소유, 애착의 무익함, 내적 자유, 자연(또는 신)과 인간의 근연성, 인간 본성 타락 등 개념을 공유했다.[121]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등 스토아 학파 저작은 많은 기독교인에게 높이 평가되었다. 스토아 학파의 아파테이아 이상은 정교회에서 완전한 윤리적 상태로 인정받는다.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는 스토아 철학을 신학에 적용했다.
유스투스 리프시우스는 고대 스토아 철학을 기독교에 적합한 형태로 부활시키려 했고, 프란시스코 산체스 데 라스 브로자스는 스페인에서 스토아주의를 추진했다. 프란시스코 데 케베도는 『스토아 학파의 교리』(1635년)로 스토아 학파와 기독교 간극을 메우려 했다.[122]
"스토익(Stoic)"은 고통, 환희 등에 무관심한 사람을 가리키며, "감정을 억제하고 끈기 있게 참는 사람"이라는 근대 용법은 1579년 명사, 1596년 형용사 형태로 처음 나타났다.[125]
5. 4. 1. 한국 사회에의 시사점
스토아 학파는 고대 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 종교, 문학 등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127]근세에는 조르다노 브루노, 스피노자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자연 사상 성립 과정에서 신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스토아 학파의 관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후기 스토아 학파의 윤리 사상은 몽테뉴와 같은 모랄리스트들에게 처세훈으로 널리 읽혔다.
현대에는 명제 간의 관계를 다루는 스토아 학파의 논리학이 재평가받고 있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인지 행동 치료가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았다. 인지 행동 치료는 모든 결정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에 따라, 환자가 자신의 생각, 느낌,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127]
스탠퍼드 철학 백과사전의 스토아 학파 항목에서는 "영국 형용사 '스토아적'의 의미는 철학적 기원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62] 현대 영어에서 "스토아적"이라는 단어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인내심을 가지고 고통을 견디는 사람을 뜻한다.[61]
20세기에 스토아 학파는 A. A. 롱의 저서 ''스토아 철학의 문제''[63][64] 출판(1971년)과 덕 윤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현대 스토아 학파 운동은 고대 스토아 철학 연구의 증가와 앨버트 엘리스[65]의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애런 T. 백의 인지 행동 치료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Stoicism
https://www.britanni[...]
2022-01-02
[2]
논문
Stoic Virtue Ethics
http://dro.deakin.ed[...]
Handbook of Virtue Ethics
2013
[3]
서적
Stoicism
2006
[4]
서적
A New Stoicism
https://books.googl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08-10
[5]
서적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6]
서적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7]
서적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8]
서적
Philosophers Speak of God
Humanity Books
1953
[9]
웹사이트
How the Stoicism Philosophy Transformed My Writing Journey
https://medium.com/@[...]
2024-11-17
[10]
서적
A History of Western Ethics
Routledge
[11]
서적
Stoicism and the Art of Happiness
John Murray
[12]
웹사이트
Chrysippus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s://iep.utm.edu/[...]
2023-08-31
[13]
서적
These Were the Greeks
Dufour Editions
[14]
서적
The Stoic Philosophy
1915
[15]
논문
The School, from Zeno to Arius Didymu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6]
서적
Hellenistic Philosophy
[17]
서적
The Hellenistic Philosoph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
문서
Stoicorum Veterum Fragmenta
[19]
서적
The Hellenistic Philosoph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20]
서적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21]
서적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22]
서적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23]
서적
Philosophers Speak of God
Humanity Books
1953
[24]
백과사전
Ancient Logic
https://plato.stanfo[...]
Metaphysics Research Lab, Stanford University
2023-06-18
[25]
논문
Stoic Metaphysics
2006
[26]
서적
Adversus Mathematicos
[27]
논문
The Stoics on Bodies and Incorporeals
2001
[28]
서적
How to Be Free - An Ancient Guide to the Stoic Lif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9]
논문
Stoic Metaphys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30]
서적
Lives of eminent philosophers
Harvard University Press
[31]
서적
The Philosophy of Early Christianity
Routledge
2021-11-18
[32]
서적
Epistles
[33]
서적
Meditations
[34]
논문
Stoic Cosm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35]
서적
Backgrounds of Early Christianity
2003
[36]
서적
Religions of the Hellenistic-Roman Age
Wm. B. Eerdmans Publishing
[37]
서적
Stoicism and Emo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8]
서적
[39]
서적
[40]
학술지
Learning from Seneca: A Stoic perspective on the art of living and education
https://research.vu.[...]
2009-00-00
[41]
서적
[42]
서적
[43]
서적
[44]
서적
[45]
서적
[46]
서적
Cicero's Tusculan Disputations
[47]
서적
[48]
서적
[49]
서적
[50]
서적
[51]
서적
[52]
서적
Introduction to ancient philosophy
Sharpe
[53]
서적
A guide to the good life: the ancient art of Stoic joy
Oxford University Press
[54]
학술지
Cato's suicide in Plutarch
[55]
서적
Discourses
[56]
서적
Discourses
[57]
서적
Moral letters to Lucilius, Letter 47: On master and slave
[58]
서적
Histories
[59]
백과사전
Ancient philosophy
http://www.rep.routl[...]
[60]
웹사이트
Stoicism | Definition, History, & Influence | Britannica
https://www.britanni[...]
[61]
웹사이트
Stoic
http://www.etymonlin[...]
2001-11-00
[62]
백과사전
Stoicism
http://plato.stanfor[...]
2004-12-13
[63]
서적
Problems in Stoicism
Athlone Press
[64]
웹사이트
Problems in Stoicism
https://philpapers.o[...]
Athlone Press
[65]
웹사이트
REBT Network: Albert Ellis |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http://www.rebtnetwo[...]
[66]
서적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67]
서적
The Philosophy of Cognitive-Behavioural Therapy: Stoicism as Ration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https://books.google[...]
Karnac
[68]
뉴스
Anxious? Depressed? Try Greek philosophy
https://www.telegrap[...]
2013-06-29
[69]
학술지
Were Neanderthals Rational? A Stoic Approach
2018-04-21
[70]
학술지
Education for the Sustainable Global Citizen: What Can We Learn from Stoic Philosophy and Freirean Environmental Pedagogies?
2018-12-00
[71]
웹사이트
The Sustainable Stoic
https://eidolon.pub/[...]
2019-02-11
[72]
논문
Sustainable Development, Wellbeing and Material Consumption: A Stoic Perspective
2018-02-10
[73]
Youtube
Stoicon 2018: Kai Whiting on Stoicism and Sustainability
https://www.youtube.[...]
2018-11-08
[74]
Youtube
A Conversation with Kai Whiting On Stoicism and Sustainability {{!}} Ideas That Matter Interview Series
https://www.youtube.[...]
2018-11-02
[75]
논문
'Wrestle to be the man philosophy wished to make you': Marcus Aurelius, reflective practitioner
[76]
서적
Pierre Hadot and the Spiritual Phenomenon of Ancient Philosophy
Oxford Blackwells
[77]
서적
La Citadelle intérieure. Introduction aux Pensées de Marc Aurèle
Fayard
[78]
서적
Exercices spirituels et philosophie antique
Paris
[79]
방송
100分de名著「マルクス・アウレリウス」『自省録』第1回 自分の「内」を見よ。
NHK
2019-04-01
[80]
웹사이트
Stoicism
http://plato.stanfor[...]
[81]
서적
Stoicism
[82]
서적
Histories
[83]
백과사전
Ancient philosophy
http://www.rep.routl[...]
[84]
서적
No Other Gods: Emergent Monotheism in Israel
https://books.google[...]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05-01
[85]
서적
Discourses
[86]
서적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87]
서적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88]
서적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89]
서적
Philosophers Speak of God
Humanity Books
[90]
서적
These Were the Greeks
Dufour Editions
[91]
서적
The Stoic Philosophy
[92]
서적
A History of Western Ethics
Routledge
[93]
서적
Hellenistic Philosophy
[94]
웹사이트
Ancient Logic
http://plato.stanfor[...]
[95]
웹사이트
Ancient Logic
http://plato.stanfor[...]
[96]
서적
Lives of eminent philosophers
Harvard University Press
[97]
서적
"Theism" and Related Categories in the Study of Ancient Religions
Society for Classical Studi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6-01
[98]
서적
Epistles
[99]
서적
Meditations
[100]
서적
Pagan Monotheism in Late Antiquity
CLARENDON PRESS • OXFORD
[101]
서적
Pagan Monotheism in Late Antiquity
CLARENDON PRESS • OXFORD
[102]
서적
Pagan Monotheism in Late Antiquity
CLARENDON PRESS • OXFORD
[103]
서적
Pagan Monotheism in Late Antiquity
CLARENDON PRESS • OXFORD
[104]
웹사이트
Passion
http://www.merriam-w[...]
Encyclopædia Britannica
[105]
서적
Stoicism and Emo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06]
서적
Epictetus' Handbook and the Tablet of Cebes
Routledge
[107]
서적
Introduction to ancient philosophy
Sharpe
[108]
논문
Cato's suicide in Plutarch AV Zadorojnyi
http://journals.camb[...]
The Classical Quarterly
[109]
서적
A guide to the good life: the ancient art of Stoic joy
Oxford University Press
[110]
서적
Pierre Hadot and the Spiritual Phenomenon of Ancient Philosophy, in Philosophy as a Way of Life
Oxford Blackwells
[111]
서적
La Citadelle intérieure. Introduction aux Pensées de Marc Aurèle.
Fayard
[112]
서적
Exercices spirituels et philosophie antique
Paris, 2nd edn
[113]
논문
'Wrestle to be the man philosophy wished to make you': Marcus Aurelius, reflective practitioner
[114]
서적
The Philosophy of Cognitive-Behavioral Therapy: Stoicism as Ration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https://books.google[...]
Karnac
[115]
서적
Discourses
[116]
서적
Discourses
[117]
서적
Moral letters to Lucilius, Letter 47: On master and slave
[118]
웹사이트
On the Duties of the Clergy
http://www.newadvent[...]
2017-03-01
[119]
서적
Meditations
https://archive.org/[...]
Penguin Books
[120]
서적
Meditations
https://archive.org/[...]
Penguin Books
[121]
서적
Backgrounds of Early Christianity
[122]
서적
The Classical Tradition
https://books.googl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10-25
[123]
서적
現代に語りかけるキリスト教
日本キリスト教団出版局
[124]
서적
現代に語りかけるキリスト教
日本キリスト教団出版局
[125]
웹사이트
Online Etymology Dictionary — Stoic
http://www.etymonlin[...]
2006-09-02
[126]
웹사이트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 Stoicism
http://plato.stanfor[...]
2004-12-13
[127]
서적
복스 포풀리
교유서가
2022-01-01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